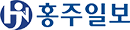홍성녹색당
책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는 아주 재미있다. 예전에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이 다 있나?”하고 감탄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나 쥘 르나르의 《홍당무》보다 더 흥미롭게 읽었다. 그래서 금방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다.
작가는 자연 양돈을 동화에 나오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 겨우 백일이 넘은 녀석들은 75kg이 넘는 덩치였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은이는 “무식하면 용감하고, 앞날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라고 애써 위안했다. 돼지를 데려오는 일부터 시작해 한 가지도 순탄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돼지는 전기 울타리를 뚫고 탈출하는가 하면 물그릇과 밥그릇을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지은이는 돼지를 키우며 많은 공부를 했음에 틀림이 없다. 책 말미에 수많은 돼지 관련 책이나 기록들이 적혀 있다. 나도 어릴 때 집에서 돼지를 키워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으며 내가 돼지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게 됐다. 돼지는 창이 없는 축사에서 산다. 도축장에 갈 때 처음으로 햇빛을 본다. 겨우 6개월을 살 뿐인데도 반 이상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 돼지에게 흔한 질병은 설사다. 습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빽빽하게 살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은 항생제이다. ‘건강한 돼지가 목표가 아니라 더 빨리, 더 많은 돼지를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돼지를 흙에서 기르기로 했다. 햇볕 잘 드는 밭에 사육장을 만들고 침실과 식당, 수영장, 화장실을 만들어 줬다. 돼지들은 지은이와 많은 사건을 만들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음에 틀림이 없다.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이름도 지어줬다. 콩이, 까망이, 팽이, 중이, 팥…….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여러 아이들이 각각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이다. 돼지에게 풀이나 싹이 난 감자, 적과한 사과, 팔고 남은 빵 등 그때그때 생기는 것들을 먹였다. 심지어 비품 유기농 요구르트를 먹이기도 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식생활을 누린 돼지가 아닐까? 여름이 되어 돼지가 더위를 타게 되자 수영장도 만들어 준다. 놀랍게도 돼지들은 물에서 하루를 보냈단다. 돼지들을 관찰하는 데 재미를 붙인 지은이는 도낏자루가 썩는 줄도 몰랐다. “좌고우면하고 우왕좌왕하는 나를 돼지들은 늘 격려해 주었다. 꿀꿀(오냐 오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져 조마조마하던 시기, 마을에 고사를 지내기로 했을 때 돼지머리를 기증하기로 결정한다. 실천가답게 지은이는 도축장에 가서 견학한 다음 직접 돼지를 잡기로 했다. 세 마리의 돼지를 차례로 잡으며 이 재미있는 책이 끝난다. 그는 도대체 왜 돼지를 기르기로 한 것일까?
“자연 양돈이란 적정한 크기의 축사에서 돼지의 본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사육하는 방식이다. 돼지들은 땅을 파며 놀고, 농가에서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으며 천천히 자란다고 했다. 생명을 정성 들여 키우고 그 생명을 죽여서 먹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고귀함을 지킨다는 면에서 채식의 연장이라고 여겨졌다.” 축산의 고장,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는 우리 홍성에 이 책이 작은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